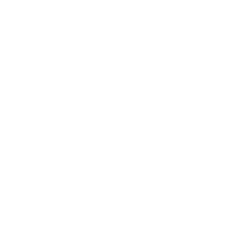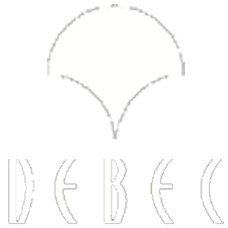자연에 그림을 짓다(박세옥작품전)
봄볕 한가로운 들녘에 서자 아무렇게나 자란 들꽃이 반긴다. 농부의 손길을 받은 밭고랑이 봄비에 젖은 듯 촉촉하다. 작품 ‘봄소식’은 바람으로 채워지는 들판에 서게 한다. 가장자리에 피기 시작한 개나리가 가던 길 멈추고 봄 멍에 빠진 나그네를 유혹한다. 경운기가 지나간 자리에 봄과 나그네와 개나리 꽃 움 틔우는 소리가 숨어 있다. 갈길 잃은 겨울의 차가운 숨내가 가늘게 이어져 이랑사이를 맴돈다. 봄을 싣고 오는 바람에, 들녘에 색을 입힌다. 작년과는 다른 생명은 봄기운을 깔고 햇살을 담아낸다. 사람들의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그림으로 보는 산문이다.
들판이 숨 쉰다. 들판의 숨은 어느새 화가의 마음에 들어 꽃으로 피는가 하더니 작업실 한켠에 자리 잡는다. 캔버스를 오가는 붓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들판이 있다. 누구도 만난 적 없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햇살 머금은 꽃이 스민다. 꽃잎에 앉은 붉은색, 흰색, 노란색이 햇살을 밀어낸다. 밀려난 햇살이 새봄의 이파리의 속살에 앉을 즈음 그녀의 봄나들이가 시작이다. 박세옥의 캔버스에는 계절이 앉는다. <나들이>시리즈다.
박세옥의 그림들은 수려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보통사람의 곁에서 보통의 꽃들을 바라보듯, 시를 짓듯 그림을 짓는다. 붉은색은 붉게, 흰색을 희게 칠하면서 거기에 소담스러운 감흥을 섞는다. 계절을 비난하지도, 시간을 거부하지도 않는 한결 같이 밝고 명랑하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은 그린다기 보다는 시간을 짓고, 계절을 짓고, 오롯한 마음을 짓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모든 순간이 후한 마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마음 구석에 엉켜있는 예술가의 욕망이 자연에 풀어지고, 봄볕에 녹고, 여름 햇살에 익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화가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과 호흡하는 일이며 물감 냄새 물씬한 작업실 한곳에서도 자연의 어느 한 곳을 지어내는 그녀의 아름다운 손끝이다.
꿈을 꾼다. 화가의 꿈이면서 꽃의 꿈이다. 여기에 샤론의 장미라 불리기도 하는 무궁화가 있다. 한여름부터 깊은 가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는 섬세한 아름다움과 은근과 끈기의 꽃말을 지닌 우리네 꽃이다. <Dreaming flower>시리즈로 함께한다. 좋음만 놓여있기를 바라는 그녀의 세상이다. 고뇌가 물감에 섞여 감성과 감정의 영역에 든다. 그림의 연륜이 더할수록 더 단순하고 단아한 꽃들이 캔버스를 채워지는 이유다. 그녀가 짓는 그림에는 산이 있고,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바람이 있다. 시간이 멈추는 곳, 온화한 성품과 편안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연이 있다. 조용한 봄날에, 화창한 여름날에, 풍성한 가을날의 어느 한곳에 머무는 시간을 본다. 엉클어진 잡풀사이로 내미는 들꽃의 향기와 사람냄새 물씬한 들녘의 기운을 흔쾌히 따라간다.
봄이 넓은 오지랖을 부린다. 유혹의 여름을 지나면서 봄의 곁과 여름의 앞섶에서 만나는 작약 꽃을 만난다. 그림이 계절을 짓자고 한다. 응달진 작업실을 벗어나 볕 따러 가자고 한다. 눈에 붓을 붙이고, 손에는 계절을 들었다. 봄 냄새 그리워지는 오늘도 그녀의 마음은 자연에 있다. 부족함 없는 세상을 위한 예술가로서의 작은 희망을 담는다. 화려하거나 출중하지는 않아도 자신의 고유색과 개성을 가진 꽃잎을 그리는 연유가 조성된다. 이것이 예술가의 꿈이면서 그림으로 짓는 희망이다.
박정수 (미술평론, 아트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