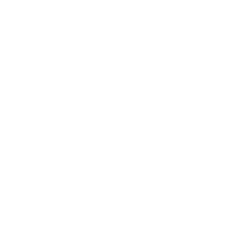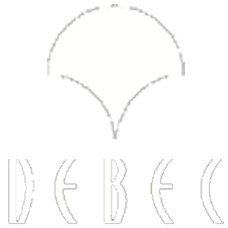“사랑과 예술의 공통점은,
그 의지만큼의 그림자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
작가 이성철은 청년작가라는 타이틀이 이제 조금은 어색해진 나이가 되었다. 청년작가로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원대한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품전을 준비한다. 2017년 두 번째 개인전 이후 6년 만에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며 작가는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셈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19일(화)부터 10월 1일(일)까지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마련된다.
바쁜 창작활동 속에서 작가는 불혹(不惑)이라는 삶의 시간과 무게를 직접 경험하며 세 번째 개인전을 준비한다. 대학졸업과 함께 무작정 시작했던 화가의 길이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예술가’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이번 전시를 통해 조용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작가는 그리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한량 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켜온 ‘바보’ 같은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다. 울타리 속삶의 무게와 더불어 그 너머의 예술이라는 가치에 남다른 무게를 담으려고 정성을 기우했다. 그것은 곧 나를 지탱하는 신념이자 목표이며, 이상이자 낭만이고, 동시에 그림자이면서 외로움의 존재였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모든 생명의 근원에 대한 깊은 탐구 즉 ‘퀘스트(Quest)’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작가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생(生)은 고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극복함으로써, 울타리 너머 행복을 인지하는 것과도 같은 새로운 깨달음에 직면하게 된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그 너머의 행복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행복이, 어쩐지 고통과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인 듯 느껴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그 울타리 너머의 행복 크기만큼, 울타리 안에서 느껴지는 삶의 그림자는 더 짙게 느껴졌던 것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곁에 머물며 사랑을 배워가는 천적지간의 친숙한 존재들을 바라보며, 바보 같은 나의 삶이 위안 받는다고 느꼈던 것은, 지켜왔던 신념의 기조가 울타리 너머의 행복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던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작은 깨달음이자 소중한 위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속 나의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었으며 그러한 그림자 역시 오롯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예술의 올바른 가치’란, 나를 가장 순수하고 진실 된 모습으로 오롯이 기록하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기에, 나의 이상과 신념을 거짓 없이 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과 고통은 곧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처럼, 결국 어떠한 이상도 울타리 속 자신의 삶을 망각하기 위함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그것을 배제한 나를 어떻게 순수하고 진실 된 모습이라 하겠는가. 비록 하나의 아름다움이 열 가지의 그림자를 낳을지언정 그것은 결코 어둠 그 자체가 아니기에, 아름다움이 곧 그림자이고, 그림자가 곧 이상이자 꿈일는지도 모르겠다.
작품 속 ‘담벼락’이라는 공간이 앞서 말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인지는 나로서도 의문이다. 적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며, 갈라지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자 동시에 무너뜨리고 싶은 타인의 마음의 장벽이기도 하다. 즉, ‘벼락’의 형태로 갈라진 벽의 균열은, ‘바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며 새겨진 스스로의 상처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며, 또한 타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막는 세상의 모든 요소를 내려치고 싶은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다.
결국 ‘담-벼락’은, 더 깊게 파고들어 부숴버리고 싶은 타인의 마음의 벽이면서 동시에 봉합하고 싶은 나의 마음의 상처이기도 하므로, 마냥 부술 수도 혹은 그냥 둘 수도 없는 존재이자, 결국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울타리 안의 나의 모습이며, 한 번쯤은 표출하고 싶었던 나약한 나의 자아이다.
이번 전시에는 수묵담채화로 제작된 5호에서 300호까지 작품 2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